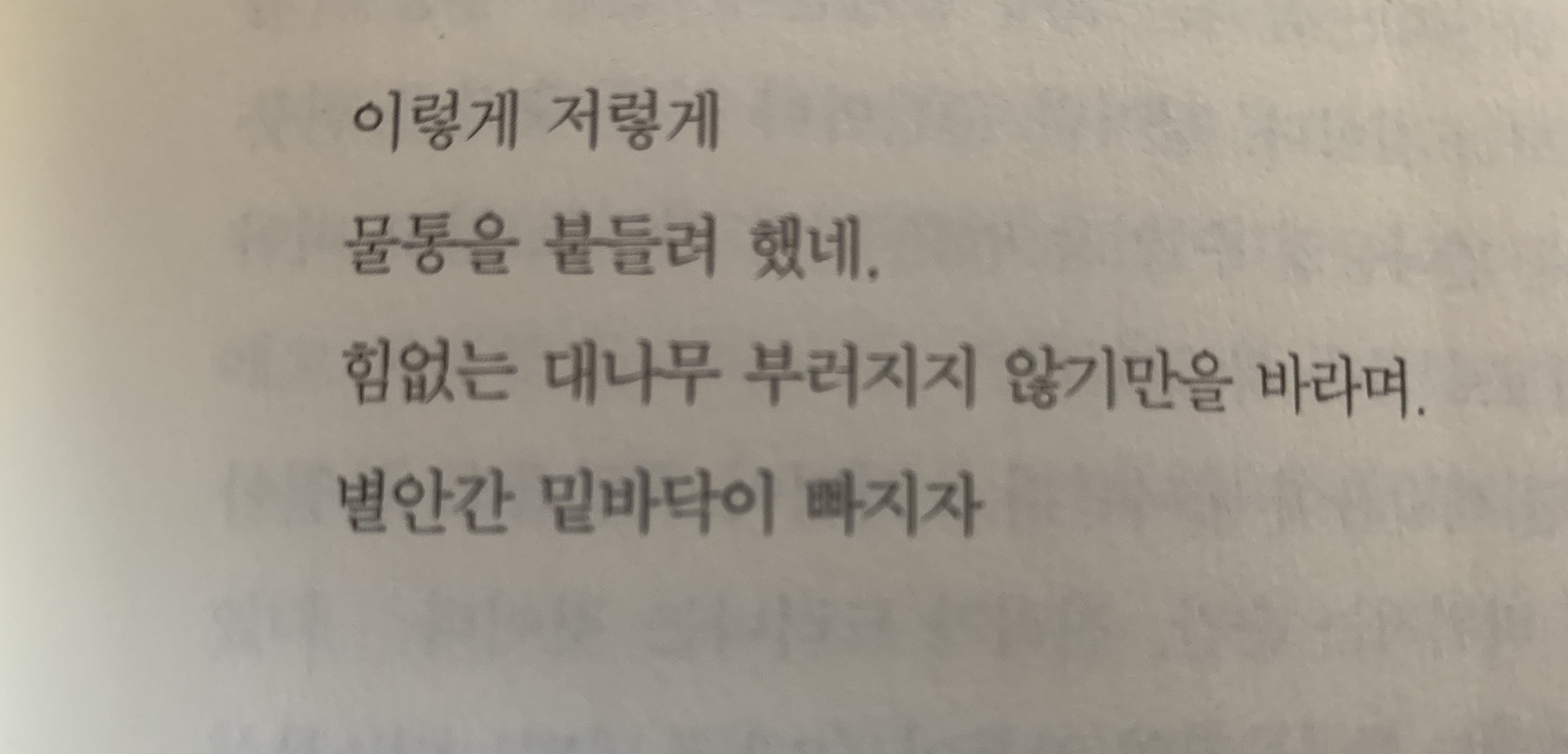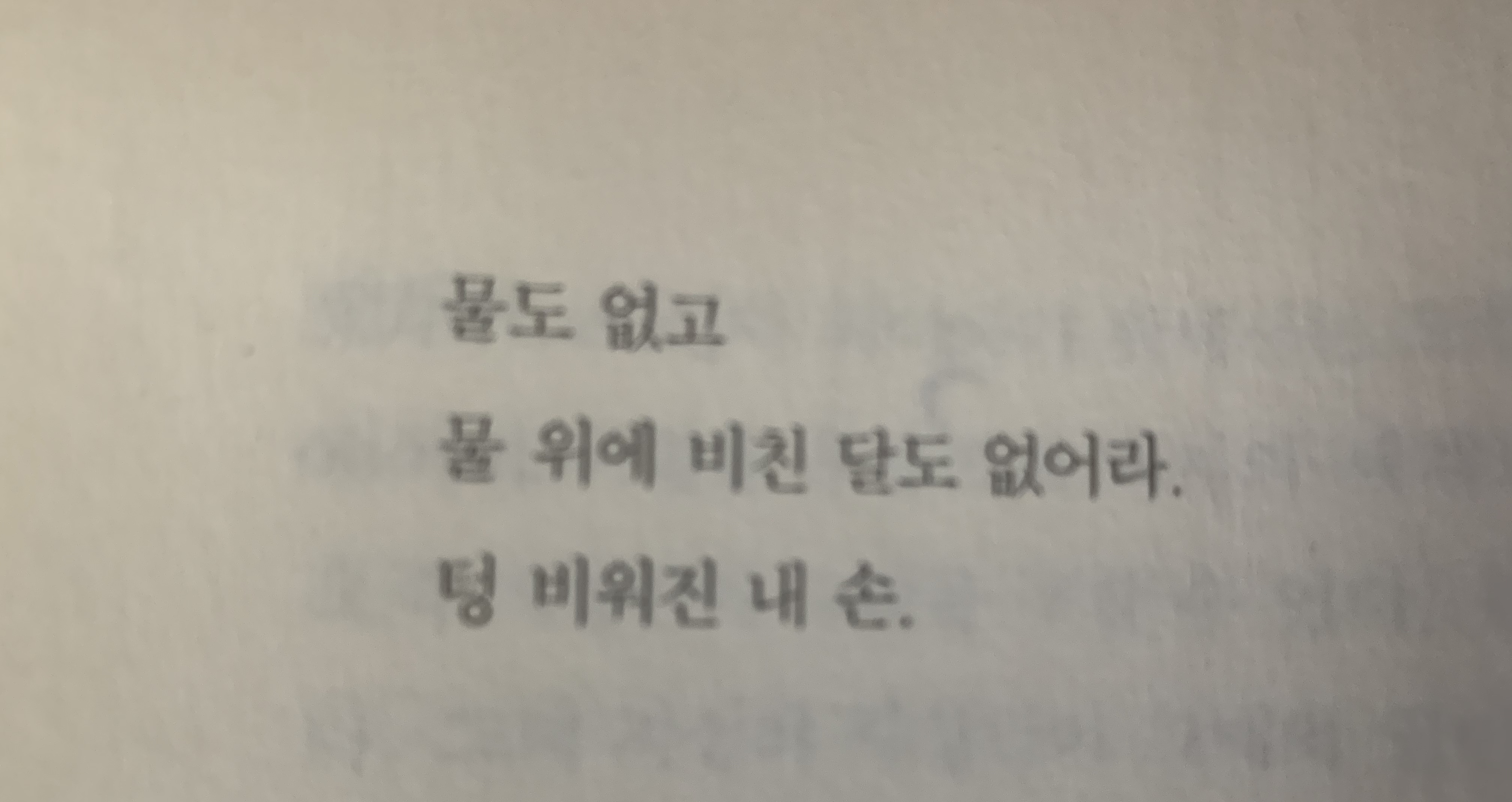좋고 싫음을 가리지만 않으면 된다.
사랑이나 미움이 없으면
모든 것이 명료해서 숨길 것이 없다.
하지만 털끝만한 구별이라도 하게 되면
하늘과 땅은 한없이 벌어진다.
그러므로 진리를 보고픈 마음이 있으면
좋다거나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한다.
좋고 싫음의 갈등
이것이 마음의 병이다.
#신심명 #승찬 #오쇼_라즈니쉬_강의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삶>은 통일체다.
존재는 분열하지 않은 채 깊은 조화 속에 머물러 있다.
그것은 일체성이다.
「이것은 아름답고 저것은 추하다」고 말하면 그것은 분열(mind)이 숨어들게 된다.
왜냐하면 <삶>은 그 양쪽이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아름다운 것은 추해지고, 추한 것은 아름다워진다.
그곳에는 울타리가 없다.
경계선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삶>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계속 흐른다.
마음에는 고정된 경계가 있다.
고정성이 마음의 본질이고 유동성이 <삶>의 본질이다.
마음에 항상 강박관념이 깃들어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것은 늘 고정돼 있고 그 자체에 고정성이 있다.
그리고 <삶>은 고체가 아니다.
그것은 유동체로 부드럽게 양극을 향해 계속 움직이고 있다.
#신심명 #승찬 #오쇼_라즈니쉬_강의
<삶>을 있는 그대로, 그 전체성(全體性)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라.
전체를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삶과 죽음을 함께, 사랑과 미움을 함께, 행복과 불행을 함께, 고민과 환희를 함께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 두 가지와 함께 살아간다면 선택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이 하나라는 점을 깨닫는다면 어디에서 선택이 들어올까?
만약 고민은 환희와 다를 바 없고, 환희는 고민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깨닫는다면-그렇게 된다면 어디에 선택이 있는 것이고,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일까?
그때 선택이 떨어져 나간다.
#신심명 #승찬 #오쇼_라즈니쉬_강의
마음의 평안은 헛되이 어지러진다.
도(道)는 광대한 허공처럼 완전하다.
모자람도 남음도 없다.
그러나, 좋다든가 안 된다는가 택한 탓으로
참 모습을 못 볼 뿐이다.
뒤얽히는 바깥 일 속에도
안쪽의 공무(空無) 속에도 살아서는 안 된다.
평온하게 무엇을 구하지도 말고
위대한 일체성 속에 머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그릇된 사물의 인식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정적을 얻으려고 행동을 억눌러 보아도
바로 그 노력이 도리어 인간을 행동으로 채운다.
어느 쪽이든 한편의 극단이 있는 한
결코 일체성을 깨달을 수는 없다.
단 하나밖에 없는 이 도(道)에 살지 않는 한
행동하는 일도 정적을 얻으려는 일도
단정하는 일도 부정하는 일도 이루지 못한다.
#신심명 #승찬 #오쇼_라즈니쉬_강의
무엇 하나 모자라는 것도 없고 무엇 하나 남는 것도 없다.
모든 것이 있어야 마땅한 모습이다.
완전히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오직 한 사람, 그대만이 들떠 있다.
오직 한 사람, 그대만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른다.
그대만이 분열돼 있다.
#신심명 #승찬 #오쇼_라즈니쉬_강의
인간은 두 영원 사이에 걸려 있는 밧줄처럼 긴장하고 있다.
때로는 자연을 향하고, 때로는 신을 향해 움직인다.
어떤 때는 이쪽, 어떤 때는 저쪽으로 끊임없이 흔들리고 동요해 안정을 찾지 못한다.
자리를 잡아라, 그러면 어느 쪽의 길이라도 상관없다.
장자는, 자연으로 돌아가 자리잡는 것을 지지한다.
자연의 품에 자리를 잡는다면 인간은 신처럼 된다.
그대는 신이 된다.
붓다는 앞으로 나아가 신이 되는 길을 지지한다.
그렇게 해도 인간은 자리를 잡는다.
뒤로 물러서든가, 아니면 갈 수 있는 마지막까지 힘차게 나아가든가다.
단, 다리 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바로 이것이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것의 하나다.
다시 말해서 뒤로 돌아가든 앞으로 나아가든 인간은 똑같은 종착역에 다다른다는 것이다.
문제는 돌아가고 나아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다리 위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데 있다.
#신심명 #승찬 #오쇼_라즈니쉬_강의
탁하지 않은 눈으로 어떤 생각도 품지 말고 그대는 그저 바라본다.
그대는 어떤 거부나 받아들임도 없이 오로지 순수하게 바라본다.
마치 자신의 눈 뒤에 사고(mind) 따위는 존재하지 않듯이, 마치 자신의 눈이 단순한 거울에 지나지 않듯이, 거울은 '아름답다'거나 '추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거울은 제 앞에 온 물체를 무엇이든 그저 비출 뿐이다.
거기에는 어떤 판단도 없다.
만약 그대의 눈 뒤에 사고(mind)가 없다면, 그 눈이 그냥 비추기만 한다면, 그것이 오로지 보기만 할 뿐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비난이나 칭찬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더할 나위없이 명료해서 해야 할 일은 아무 것도 없다.
이 명료성, 의견도 편견도 지니지 않는 이 눈-그것으로 그대는 광명을 얻는다.
#신심명 #승찬 #오쇼_라즈니쉬_강의
왜냐하면 노력은 행위에 속하기 때문이다.
아무도 수동적이려고 애를 쓸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가?
행동적이 되어라.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면 수동성이 찾아온다.
그것은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그것은 오지 않을 수 없다.
오로지 생각토록 하라.
그러면 무념이 찾아온다.
그대가 사고를 떨쳐 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완전한 것은 결코 떨쳐 버리지 못한다.
완전한 것만 떨쳐 버릴 수 있다.
실제로 완전한 것은 스스로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간다.
행동적이 되어라.
행동 그 자체가 수동성이 일어나는 상황을 만들어 낸다.
#신심명 #승찬 #오쇼_라즈니쉬_강의
그때 두 극단이 만나고 미묘한 균형이 이루어진다.
그 미묘한 균형이 사먀크트바(samyktva)다.
그 미묘한 균형이 정적이다.
그 미묘한 균형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평안, 절정, 최고의 상태다.
왜냐하면 양쪽이 균형을 이룰 때-바깥과 안, 능동성과 수동성이 균형을 유지할 때-갑자기 인간은 그 양쪽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그 양쪽이 균형을 이룰 때 그대는 이미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다.
갑자기 그대는 제3의 세력-방관자, 목격자다.
하지만, 그것은 분투로써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신심명 #승찬 #오쇼_라즈니쉬_강의
하지만 시도해 보라, 그것도 모든 일에.
그대가 누구에게 미움을 느낀다면 한 가운데 이동하려고 애써 보라.
그대가 누구에게 사랑을 느낀다면 한 가운데로 옮기려고 애써 보라.
무엇을 느끼든 그대가 한 가운데로 움직이려 애를 쓴다면 틀림없이 놀라게 될 것이다.
모든 양 극단의 사이에 그 양쪽이 존재하지 않는 지점이 있다.
그것은 사랑도 느끼지 않고 미움도 느끼지 않게 되는 지점이다.
이것이 붓다가 우페크샤, 즉 무관심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무관심이라는 것은 딱 들어맞는 말이 아니다.
우페크샤란 그곳에 서면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그런 중간점을 뜻한다.
그곳에서는 이미 「나는 사랑한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나는 미워한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그곳에서는 그저 아무말도 하지 않는다.
오로지 한 가운데에 있을 뿐이다.
누구한테도 동화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초월이 일어난다.
그리고 바로 그 초월이 개화(開花)다.
바로 그것이 달성해야만 하는 성숙, 바로 그곳이 종착역이다.
#신심명 #승찬 #오쇼_라즈니쉬_강의
그 진실을 놓치게 된다.
세상만사의 공허를 주장하면
역시 그 진실을 놓치게 된다.
그에 대해서 말하거나 생각하는 만큼
진리에서 멀리 떨어진다.
말이나 생각을 그만 두는 게 좋다.
그러면 모를 일 무엇 하나 없다.
#신심명 #승찬
만지는 것은 직접적이다.
하지만 생각하는 것은 간접적이다.
생각하면 놓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는 실재를 알 수 있다.
춤추는 자도 그것을 알 수 있다.
노래하는 자는 그것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생각하는 자는 실재를 계속해서 놓친다.
'THE BOOK > 서가 속 영혼의 목소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님도 모르는 반야심경 / 김종수 (0) | 2020.07.31 |
|---|---|
| 내 옆에는 왜 이상한 사람이 많을까? = 재수 없고 짜증나는 12가지 진상형 인간 대응법 (0) | 2020.06.25 |
| 삶과 죽음에 대하여 / 지두 크리슈나무르티 (0) | 2020.06.11 |
| 신심명 / 승찬 (0) | 2020.05.25 |
| 치요노千代能 / 오도송悟道頌 (0) | 2020.05.21 |